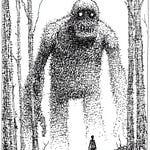그녀는 아침 내내 허리 바로 위쪽에 있는 짜증나는 가려움증을 긁어댔고, 이제는 긁는 도중에 손가락이 예상보다 깊이 들어갔다.
[She’d scratched at the itch all morning, a nagging thing just above her waistline, and now, mid-scratch, her fingers sank deeper than they should.]
그녀는 멈췄다. 눈을 깜빡였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긁었다. 예상대로, 손톱이 피부 밑으로 사라졌지만, 피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일부분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또 다른 부분은 웃고 싶었지만, 둘 다 적절한 반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배를 내려다보며, 손을 반쯤 집어넣은 채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
[She stopped. Blinked. Scratched again, just to check. Sure enough, her nails disappeared beneath the skin, but not like skin should stretch or tear—more like there wasn’t anything there at all. A small part of her wanted to scream, or maybe laugh, but neither seemed like the right response. So instead, she just stood there, staring down at her stomach, hand halfway in, halfway out, feeling… nothing.]
"이건 처음이네," 그녀는 생각했다. 엄지손가락이 근육이나 지방이어야 할 곳의 가장자리를 스치며, 공기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Well, that’s new, she thought, her thumb brushing the edge of what should have been muscle or fat but felt more like air.]
천천히 손을 빼면서, 배가 닫히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누군가 몸 한가운데에 구멍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이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혹시라도 거리를 두면 뭔가 달라질까 싶어서. 하지만 그 구멍—대략 자두 크기 정도였는데—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할 곳에 깔끔하게 뚫린 구멍처럼.
[She pulled her hand out slowly, watching as her belly didn’t close up, didn’t react at all, like it was perfectly normal for someone to have a hole in the middle of themselves. She took a step back, like maybe distance would change things, but the hole—about the size of a plum, maybe—stayed right there, a neat little absence where something important should be.]
아프지는 않았다.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아프려나.
[It didn’t hurt. Shouldn’t it hurt? Maybe it would later.]
그녀는 전화기를 집으려다 멈췄다. 이런 상황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지? 간호사 상담 전화를 상상해보았다.
["Hi, yes, so there’s a hole in me. No, no blood, just a hole. It’s about the size of a fruit, kind of soft around the edges. Not bleeding. No, not bleeding at all. Actually, kind of clean. Should I come in for that?"]
그렇지. 그런 말 했다가는 정신병원에 가서 약 왕창 먹게 되겠지.
[Right. Like that wouldn’t get her a padded room and some heavy meds.]
그녀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쩌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 그저 구멍일 뿐이야. 불편하긴 해도, 치명적인 건 아니지. 구멍은 메우면 되는 거잖아.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패치든, 바느질이든, 접착제든, 다 고칠 수 있지. 그런데 계속 쳐다보면 볼수록 뭔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았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근본적인 무언가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She looked down again. Maybe it wasn’t as bad as it looked. Yeah, it was just a hole, an inconvenient one, sure, but nothing catastrophic. Holes could be fixed. She knew that. Patches, stitches, glue. All fixable. But the more she stared, the more it seemed... wrong in a way that her mind couldn’t quite wrap around. Like something fundamental had slipped away when she wasn’t paying attention.]
그녀는 가장자리 부분을 눌러보았다. 살의 경계를 찾고, 뭔가를 당겨서 다시 붙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손은 그냥... 들어갔다.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손끝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고, 어쩌면 공기보다도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듯했다. 손끝은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끝도 없고, 뼈도 없고, 장기 같은 내부의 촉감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있을 뿐이었다.
[She pressed her fingers around the edge, expecting to find a border of flesh to tug at, something to reattach, but her hand just... went in. She felt nothing inside. Her fingertips floated in air, maybe deeper than air. They weren’t touching anything. There was no end, no bone, no internal squish of organs. Just empty.]
다시 손을 빼냈다. 이번에는 희미하게 젖은 소리가 났다. 마치 진흙 속에서 부츠를 빼낼 때처럼. 그런데 진흙도 없고, 부츠도 없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She pulled her hand out again, and this time there was a faint, wet sound, like pulling your boot from the mud. Except there was no mud. No boot. No explanation at all.]
뭐야, 이게?
[What the hell?]
복도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완벽히 정상으로 보였다. 배에 있는 그 구멍만 빼면. 기대했던 것처럼 축 처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그 구멍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왜 놀라야 하는지, 왜 아무것도 없는데도 서 있는지, 그런 걸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Her reflection in the hallway mirror stared back, looking perfectly normal, except for that hollow in her belly. It didn’t even sag like you’d expect. Her body was treating it like it had always been there. Like there was no reason to panic, no reason to question how she was still standing with nothing inside her.]
그녀는 구멍 위에 손바닥을 대고, 그것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했다. 마치 바람이 다 빠진 풍선을 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을 찔렀다. 구멍이 흔들렸다.
[She pressed a palm over the hole, trying to smooth it out. It was like pressing on a balloon that had lost all its air. She poked it. It wobbled.]
이건 아니잖아.
["This wasn’t right."]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녀는 어색하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Okay, this is fine," she said, her voice unnervingly calm. "It’s not fine, but it’s fine."]
출근할 수 있겠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 이게 뭐긴 뭐야? 그냥 몸이 잠깐 이상한 거겠지? 그런 거야. 늘 그런 식이잖아—물집, 멍, 아마존 강 모양의 이상한 발진도 있었지. 그것도 나았으니, 이건 당연히 나을 거야, 안 그래?
["Maybe she could go to work. People didn’t have to know about this. What was it, anyway? A minor body malfunction? She had those all the time—blisters, bruises, once a weird rash that looked like the Amazon river. That had cleared up. This would too, right?"]
부드러운 쩝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아래를 보니, 구멍이 더 커져 있었다.
["A soft slurp sound interrupted her thoughts. She looked down. The hole had gotten bigger."]
이젠 대략 사과 크기. 그것도 큰 사과. 갈라 애플 같은, 밝은 빨간색에, 한 번에 다 먹기 힘든 그런 종류.
["Now it was more like the size of an apple. A big one. One of those gala apples, bright red, the kind you never finished in one sitting."]
"젠장."
["Shit."]
그 단어는 공기 중에 사실처럼 떠돌았다. 중력만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아직 다리에 감각이 남아있었다. 다리에 힘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몸은... 얼마나 더 사라질까?
["The word hung in the air like a fact, as irrefutable as gravity. She could still feel her legs beneath her, still stand on them, but the rest of her—how much more would disappear?"]
어쩌면 웃긴 일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걸 생각하진 않잖아. "오늘은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날이네,"라고 말하진 않으니까.
["It was funny, in a way. You didn’t think about this when you woke up. You didn’t say, 'Today’s the day I start dissolving.'"]
그녀의 손가락이 새로운 가장자리를 따라갔다. 완벽한 원형, 넓어지는 구멍. 외과 수술 같은 깔끔함인데, 정교함도 과학도 없었다. 그냥... 사라진 거였다.
["Her fingers traced the new edge, a perfect, widening circle, clean as a surgical cut but without the precision, without the science. Just... gone."]
만약 팔을 끝까지 넣으면 계속 들어갈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어쩌면 탐험할 수도 있겠지, 동굴 탐험 같은 거. 돌 대신 배 속 빈 공간을 탐험하는 거지만.
["If she stuck her arm all the way in, would it keep going? She thought about it for a second. Maybe she could explore it, like spelunking, but with less rock and more stomach void."]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가 진동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몸 속 구멍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게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지는지 갑자기 깨달았다. 하지만 알림은 "업무 이메일"이라고 떴고, 왠지 그게 더 급한 일처럼 느껴졌다. 이 구멍보다 더 말이다.
["Her phone buzzed on the table. She looked at it, suddenly aware of how trivial everything else seemed in comparison to the hole in her body. But the notification said 'Work Email,' and somehow that felt urgent. More urgent than this, apparently."]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을. 몸 속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She didn’t check it. Just stared at the screen, then back at herself. Back at the nothing in her."]
Enjoyed the story? Support by leaving a like 👍, restacking 🔁, or sharing it with others.